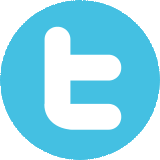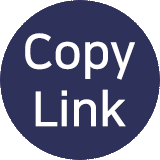-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4층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 +82-2-794-4146 +82-2-794-3146 문의
Session I : 연구윤리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 위조, 변조, 표절 관련 체크리스트 |
|
우리나라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리고 “그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1].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연구진실성위원회(Office of Research Integrity)에서는 연구를 제안, 수행 또는 검토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의 위조, 변조, 혹은 표절의 세 가지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견해의 차이나 고의성이 없는 실수(honest error)는 연구 부정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2]. 연구 부정행위는 공적 자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연구 공동체의 신뢰를 약화하고 왜곡된 연구 결과가 공동 정책, 의료, 기술개발 등에 잘못 활용되어 공중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관 및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연구 부정행위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를 식별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미국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2023년도에 353건의 제보가 있었으며, 미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의 확인 결과 이 중 11건이 연구 부정행위로 분류되었는데, 위조 1건, 위조 및 변조 8건, 위조와 변조 및 표절 2건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 연구 부정행위의 형태는 위조, 변조, 표절 중 하나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 부정행위는 그 속성상 보고된 사례보다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보고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 위조 및 변조
1) 정의
우리나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에서는 ‘위조’를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로,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1]. 이는 미국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제시한 정의와 동일하다.
|
위조의 예: 변조의 예: |
2) 연구 부정행위 판단 기준
위조 및 변조를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려면 일반적인 연구계의 관행에서 심각하게 벗어나야 하고, 의도적(intentionally)이거나 고의적(knowingly)으로, 무모하게(recklessly)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미국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단순한, 혹은 비고의적인 오류(simple or honest error)나 판단 및 의견의 차이(difference in judgement or opinion)를 연구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최근 이미지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연구자가 원하는 결과를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이미지의 음영 조절, 배경 삭제, 특정 부분의 강조 등은 변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원자료를 있는 그대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하며, 자료는 목적에 맞게 가공하되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편향되거나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 연구 노트 작성 시에는 기재 내용의 위조, 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4].
2. 표절
1) 정의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및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1]. 미국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표절을 타인의 생각, (연구) 과정, 결과, 혹은 단어를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판단의 기준
표절도 위조나 변조와 동일하게, 단순하거나 비고의적인 오류는 연구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2].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의 절도나 유용(연구비 심사나 원고 심사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획득한 아이디어나 독특한 방법의 무단 사용 포함), 타인의 저작물을 상당 부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자의 자격이나 신용 분쟁(credit disputes)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론이나, 이전 연구를 설명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의 제한된 사용은 허용된다. 즉, 특정 연구자의 독창적인 연구 방법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출처를 명확히 제시해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표절(self-plagiarism)은 표절의 한 형태로, 연구자가 과거에 썼던 글이나 자료를 다른 문헌에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자기 표절은 이중 게재에서 텍스트 재사용까지 넓은 부분을 포함하는데, 미국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자기 표절을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5].
표절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도 표절은 적용되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연구 부정행위의 판단 및 조치
연구 부정행위의 판단에 있어, 우리나라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하였는지, ‘행위자의 고의, 연구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1].
연구자가 아닌 제3자, 특히 학술지 편집인이 연구의 위조 및 변조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는 편집인은 학술지에 제출되거나 게재된 원고의 부정행위를 추적하고 이미 게재된 사기성 논문을 취소할 책임이 있으나, 편집인이 완전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과학적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러한 책임은 연구가 수행된 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에서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표절 감시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위 ∙ 변조 탐지 프로그램이 표절과 이미지 위 ∙ 변조의 적발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부정행위 발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독자 혹은 심사자가 위조 및 변조, 표절 의혹을 알리게 되면 편집인은 이러한 의혹을 알려온 심사자와 독자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조사 계획에 대해 알려야 한다. 증거 문서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전체 증거 문서를 수집하고, 표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여 명백한 출판윤리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대부분의 학술지는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6]. COPE 웹사이트에는 위조, 변조, 표절에 관련된 사례가 많이 제시되어 있으며,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편집장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지침, 연구 진실성 케이스에 관한 연구기관과 학술지의 협력에 관한 지침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23. 7. 17.]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
-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 Definition of research misconduct [Internet]. ORI; c2025. Available from: https://ori.hhs.gov/federal-research-misconduct-policy. https://ori.hhs.gov/definition-research-misconduct
-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 ORI Annual report: fiscal year 2023 [Interne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4. Available from: https://ori.hhs.gov/sites/default/files/2024-06/FY%202023%20ORI%20Annual%20Report_FINAL_0.pdf
-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자를 위한 연구윤리 필독서. 한국연구재단; 2024.
-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 Self-plagiarism [Internet]. ORI; c2025. Available from: https://ori.hhs.gov/self-plagiarism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Guidelines and flowcharts of COPE [Internet]. COPE; c2025. Available from: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f%5B0%5D=type%3A16
※ 의편협 파일서버 업로드 및 KoreaMed & KoreaMed Synapse 관련 문의
※ 의편협 파일서버 업로드 및 KoreaMed & KoreaMed Synapse 관련 문의
- 안내사항: https://www.kamje.or.kr/auth/file_server
- 직통전화: 02-6966-4930
- 이메일: support@m2-p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