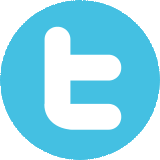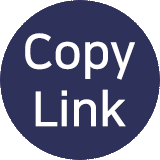-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4층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 +82-2-794-4146 +82-2-794-3146 office@kamje.or.kr
한국의학 학술지의 미래

허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제9대 의편협 회장)
*2024년 3월 23일(토), 강남구 베어홀에서 열린 2024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임.
머리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예측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연자는 2023년 3월 25일 열린 2023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서 plenary lecture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 당시 의편협 학술지 280종 가운데 PubMed 132종, Scopus 138종,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105종이 등재되었다. 그리고 2043년에는 MEDLINE 100종, PMC 250종, Scopus 250종, Web of Science 200종 정도가 등재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 당시에도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언급하였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고, 우리 의학 학술지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언급하려고 한다. 이런 언급이 지금도 병원,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잡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편집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이런 바람과 제안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도 무방하다. 구체적으로는 Web of Science에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가 어느 위치에 자리 매김하여야 할지, 편집인이 언제까지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잡지를 운영할 수 있을지, 우리도 국제 수준 출판사를 국내에서 키우려면 어떻게 노력하여야 할지 등을 언급하려고 한다.
20년 후 의학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학술지가 담을 의학이 어떤 내용일지 알아야 학술지도 따라갈 것이다. 2024년도는 2022년도 말부터 불어닥친 생성성 인공지능 열풍이 지속될 것이다. 현재 deep learning, deep neural network으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판단형 인공지능이 우리 옆에 다가왔다. 의학에서 지금 결정할 것은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느냐이다. 게놈 연구, 새 약제 개발도 인공지능 덕분에 매우 효율이 높아져서 맞춤의학도 진화하고 약제 개발 속도도 빨라졌다. 이제 6G가 실용화되고 양자컴퓨터가 우리 일상에 다가오면, 의학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설까? 하이퍼루프로 이동하게 되면 병 · 의원의 위치에 따른 접근도가 과거보다 덜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온라인 로봇 수술이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 파병 장병뿐 아니라 해외 거주민도 진료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학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20년 후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모든 과학 기술 발전의 최고 목표에는 의학 발전이 있으므로 우리 의료 현장도 매우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의사 단체의 의견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현실이 된다고 가정할 때, 20년이 지나면 10만 명의 의사가 더 배출되게 된다. 그러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지, 현장에서 인력 훈련이 부담되어 학문은 더 후퇴하게 될지 알 수 없다.
20년 뒤 의학 학술지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재편될까?
이미 학술지가 온라인 시장으로 접어든 1990년대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시장은 더 확대되고, 전통적인 Elsevier, Springer Nature, Wiley-Blackwell, Sage, Taylor-Francis 등 대형 상업출판사와 더불어 떠오르는 open access 출판사인 MDPI, Frontiers 등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학회 차원에서 아웃소싱으로 출판하는 개별 비영리 단체는 이런 대형 출판사의 마케팅이나 기술 도입을 따라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Nature나 Lancet, JAMA 등의 저널이 계속 자매지를 생산하고 있고, 그동안 잠잠하던 NEJM까지 드디어 ‘NEJM AI’라는 자매지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미 이런 기존 브랜드를 확보한 곳은 지속하여 거미줄처럼 분야마다 잡지를 발행하여 시장 장악력을 키우고 있다. Elsevier, Springer Nature의 2강 체제에서, 경쟁이 어려운 출판사는 계속 인수 합병을 통하여 몸집을 키울 것이며, open access 출판사는 끊임없이 학술지 종수를 늘려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는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처럼 대형 출판사 브랜드 아래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학회지가 협력하여 경쟁할 수 있는 출판사를 지원하여, Lancet처럼 full time managing editor가 있는 출판사로 키우는 체제를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편집인이나 일부 위원의 헌신과 봉사로만 학회지를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Lancet 편집인 Dr. Richard Horton처럼 1995년부터 40년째 일하는 편집인을 초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특징
중국에서 Journal Impact Factor (JIF)가 높은 학술지는 하나 같이 구미의 대형 상업 출판사와 협력한다. 우리처럼 학회 단위에서 운영하는 잡지는 매우 드물다. 일본 역시 JIF 상위 10위까지의 잡지는 9종이 대형 상업출판사와 협력하고 있고, 한 종만 학회가 발행한다. 반면,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는 해외 상업출판사와 협력하는 학술지는 전체 의편협 학술지 가운데 10종 미만으로, 대부분 학회가 발행하고 출판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의편협 학술지 가운데 2022년 JIF 상위 20종 학술지 가운데 해외 상업출판사와 협력하는 학술지는 2종(10%)이다. 즉, editor-publisher가 우리나라 편집인과 학술지의 특징이다.
Editor-publisher의 과제
우리나라 학술지가 저렴한 경비로 출판하여 게재료가 높지 않거나 아예 무료이므로 해외에서 보기에는 환상적인 잡지이기도 하지만, 새 정책이나 추세를 반영하는 데 학회마다 다 따로 공부하여야 하며, 모두 다른 style과 format을 적용하므로 아웃소싱을 맡은 회사도 매우 힘들다. 사실, 학술지 정책 및 style과 format은 aims and scope와 심사 유형(single-blind, double-blind, open) 등 몇 가지만 제외하면 모두 통일하여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편집인은 aims and scope와 심사 유형, article processing charge, open-access type만 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출판사가 알아서 정리하고, 정책이나 투고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특히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4th version”에 대한 기술을 통일하면 편집인이 매우 편할 것이다. 다양한 정책을 통일적으로 정리한다면 여러 색인 database 신청에서도 빠트리지 않고 심사 항목을 채울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의학 학술지는 이 best practice를 별도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까다로운 것이 없고 그냥 가져다 실으면 되는 보편적인 내용이므로 출판사가 도와준다면 편할 것이다. 특히 Scopus나 MEDLINE 등재를 준비한다면 이 내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Managing editor를 고용할 수 있을까?
Lancet에 논문을 투고하면, 일단 accept가 된 후 전문가가 모든 내용을 샅샅이 점검하여 영문과 정보 흐름을 다듬고, 표나 그림을 다듬어서 제공하며 저자 의견을 묻는다. 이런 전문가 서비스는 현재 국제 상업출판사와 협력하는 학회도 제공받지 못한다. Lancet과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편당 USD 6,830 정도는 내야 가능하다. 즉, 우리나라 학술지는 대형 출판사와 협력하여도 대부분 이런 고급 서비스는 받기 어렵고, 그냥 브랜드 이름을 얻는 정도의 혜택이 있을 뿐이다. 원고 편집조차 별도 경비를 지출하라는 출판사도 있다. 우리는 이 작업을 대부분 자원봉사로 편집인이나 편집위원이 맡는다. 이런 managing editor는 대개 생물학 분야 박사로, 이런 잡지 편집에 copy editor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이다. 우리도 이렇게 편집을 하려면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학회가 경비를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게재료를 충분히 받아서 운영하는 도리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과총에서 받는 학술지 발행 지원도 2,000만 원 이상은 어렵다. 만약 게재료를 편당 USD 3,000을 받는다고 할 때, 100편 이상 발행하면 약 4억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 출판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연봉을 받는 전문가가 많아지면 학술지의 수준이 올라가고, 편집인도 편하게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다. 단지 원고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심사하여 accept를 결정한 이후 나머지 과정을 다 출판사가 챙겨준다면 편집인도 오랜 기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JIF 전체 100위 안에 1종 포함, 범주별로 10% 이상에 70종이 가능할까?
임상의학은 59범주, 심리학/정신과학은 1범주, 생물 · 화학이 15범주에 해당하므로, 범주마다 최소 1종이 상위 10% 이내에 드는 것을 목표로 세울 수 있다. 또한 전체 100위 안에 들려면 JIF가 28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목표가 지금 현황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 Q1 (상위 25%) 국내지가 27종이고, 그중에 의편협 학술지는 12종인 상황에서, 우선 Q1에 70종 포함을 먼저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다. 어렵다 해도 이런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야 언젠가는 가능하다. 앞으로 JIF는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Clarivate에서 SCIE 등재지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ESCI 등재지는 계속 확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open access mega journal이 논문 수를 끝없이 늘려 나갈 것이므로, 인용 횟수도 점점 더 늘어나서 JIF가 상승할 것이다.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처럼 원저 참고문헌을 15편으로 제한하는 학술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대개는 제한이 없다. 온라인에서는 지면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인용을 많이 받을만한 원고를 투고 받는 것이 최선이나, 인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multi-national randomized controlled study, cohort study 등은 대개 의학 분야 저명지부터 투고하였다가 reject 될 경우 차차 JIF가 낮은 학술지로 내려가므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까지 오는 것은 JIF 5 이상인 학술지 외에는 참 쉽지 않다. 결국 그런 주제를 우리가 초빙해야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편집위원이 써야 한다. 또한 어느 주제가 많이 인용될지 파악하여 대거 싣는 방법이 있다. Lancet이 COVID-19 pandemic 당시에 원고를 매우 빠르게 받아서 NEJM보다 JIF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예이다. 그 외에도 hot issue를 correspondence로 실어서 인용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문제는 누가 이런 hot issue를 찾아서 작성하고 투고할 것인가이다. 전적으로 이런 내용만 추적하면서 선제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 full time editor가 아니라면 쉽지 않은 일이다.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의 예
연자가 editor를 맡은 학술지인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는 교육 평가가 주제이다. 2020년도 COVID-19 pandemic이 시작할 때 이것을 주제로 한 논문을 실어야 하는데, 주제 분야가 다르다 보니 초빙도 어려워서 editorial로 직접 썼고(“How to train health personnel to protect themselves from SARS-CoV-2 [novel coronavirus] infection when caring for a patient or suspected case”), Web of Science에서 113회 인용되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었을 때, 한국학술정보연구원 연구 보고서의 저자에 연락하여 해당 보고서를 축소 번역하여 게재하여(“Educational applications of metavers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188회 인용되었다. 2023년도에는 바야흐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래하여 이 내용으로 한 편 싣고 싶은데, 막 시작할 즈음이라 요청할 대상도 없어 사흘 만에 한 편을 작성하여 실었다(Are ChatGPT's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ability comparable to those of medical students in Korea for taking a parasitology examination?: a descriptive study). 이것은 98회 인용되었다. 이러한 예상들은 정확하게 맞아 많은 인용을 받아서, 2022년 JIF가 4.4, 2023년에는 9 이상이 되는 데 공헌하였다. 즉, 떠오르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쉽게 인용할 수 있는 쉬운 논문을 발굴하여야 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편집인과 위원이 원고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굴해 내기가 어려운 것은, 과연 그렇게 발굴한 논문이 인용을 많이 받을지 게재 결정 시점에선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다 맞출 수 있다면 매우 쉽게 인용도를 올릴 것이다. 기대하지 못하였지만 예상외로 인용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2021년도 발행한 통계 도구 관련 논문(“Sample size determination and power analysis using the G*Power software”)은 무려 413회나 인용을 받았다. 우리나라 학술지가 아무리 JIF가 올라가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우리나라 잡지에 원저를 투고하지 않는다는 선배 편집인 말씀대로, 우리는 아직 학술지 브랜드가 높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이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도리밖에 없다.
의학 학술지의 목표는 JIF 상승이 아니다?
당연하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고, 학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원고를 잘 편집하여 학술지 누리집이나 PMC에 open-access로 올리고, 전 세계 누구나 이를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PMC에 올리면 세계 어디선가 본다, 늘 누군가 열심히 꼼꼼하게 우리 잡지를 보고 있다고 여기면서 편집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행복한데, 문제는 국내 연구자나 학회 회원조차 SCIE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잡지에 투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SCIE 등재지인데도 JIF가 낮다고 투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처럼 JIF를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업적 평가를 하는 추세는 20년 뒤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문 자체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라 공정하지 않으며 양적 평가가 공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나 연구비 지원 기관은 이런 양적 평가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 시비의 소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 - 어떻게 할까?
이런 구조 속에서 국내 의학 학술지 편집인은 1996년에 의편협을 조직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발행하였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우리나라 의학의 주역이 되는 20년 뒤 과연 지금처럼 헌신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들은 외부에서 온갖 협박을 하여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세대인 것이다. 이러한 세대가 편집을 맡을 때 지금처럼 희생과 봉사를 강요할 수 있겠는가? 미래를 대비하여 출판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하여 누가 맡아도 즐겁고 큰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일은 사람과 돈이다. 미래 의학의 주역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재이며 신인류이다. 이런 젊은 천재들이 학술지에도 흥미를 느끼고 기꺼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결국 돈이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여 이 천재 신인류가 미래 학술지를 짊어지고 나가도록 배려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 궁리하여야 할 때이다.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결국 JIF를 올리면서 게재료를 올리고 전문가와 출판사를 키워야 할 것이다. 아니면 다 해외 상업회사에 학술지를 맡기고, 우리는 심사만 하고 다른 것은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다. 경비는 해외 상업회사가 알아서 하고 수익을 남기는 것도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다. 시간과 돈을 들여 국내 출판사를 키우느니 그냥 해외 상업출판사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면 응답하기 어렵다. 국제화 시대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지, 국내와 국제 출판사를 왜 구별하는지도 논리가 궁색하다. 학술지 시장에서 국내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서라고 경제적인 이유를 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문 논문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최근 의학 분야에서 국문 논문은 찾기 힘들고 투고할 곳도 많지 않다. 그래도 아래아한글과 Naver가 살아남은 나라의 백성으로, 학술지도 우리나라 회사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여기는 고리타분한 민족중흥의 사명을 타고 난 편집인이기에 이런 의견을 제안한다(2024.3.7.).